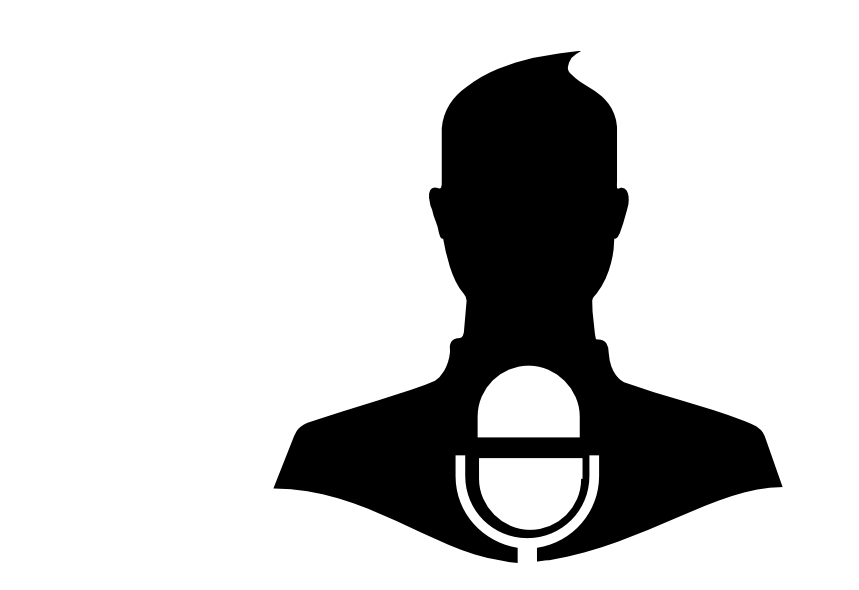
‘지방의회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계절이 돌아왔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등 광역의회와 다수 기초의회가 11월 행감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행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이 존재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는 의원들이 수험생과 같은 마음으로 행감에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충청권 광역의회는 “최악의 행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대전시의회 행감에 대해 “8대 의회 개원 후 최악”이라는 혹평을 했다. “몇 개의 질의를 제외하면 질의의 핵심을 찾아보기 힘들고, 자료 확인, 당부로 그치는 것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행감을 실시한 세종시의회도 시민단체로부터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의회와 마찬가지로 “단편적 질의에 그쳤다”는 평가가 주류였다. 지난해 충남도의회 행감은 ‘송곳 질의’가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막말과 고성논란이 이슈가 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국장을 대신해 답변하려는 팀장에게 “건방지다. 발언권도 없으면서”라고 고성을 지르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해당 의원은 소속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렇듯 해마다 ‘맹물 행감’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지방의회가 이번에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내년 지방선거 전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에 의원들의 마음은 온통 콩 밭에 나가 있다. ‘줄 서기를 잘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구태가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게 나온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독자적 정치행보를 걷는 지방의원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지역위원장의 수족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런 지방의원들에게 행감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정치생명의 연장을 유권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윗분(?)에게 구하는 현실이 반복되는 한 달라지지 않을 풍경이다.
그렇다고 ‘행감’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어버리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 대선 이슈로 급부상한 ‘대장동 개발’ 문제도 엄밀하게는 성남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다뤘어야 할 지방행정의 문제였다. 더 이상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만 가둬둘 수 없는 세상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이나 ‘맹물 행감’ 논란 등으로 냉소만 보내는데 그친다면,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진흙 속 진주를 찾듯 어려운 일이겠지만 ‘행감 스타’를 찾아내고 응원하는 것도 유용한 정치참여의 한 방법이다.
